[전자신문] '전기차 보조금정책, 이대론 안된다'

<지난 4일 한국전기차사용자협회(KEVUA)가 제주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전기차 사용자 및 환경부·한국전력 전기차(충전) 보급 담당자와 함께 '환경부 전기차 보조금 정책 개선'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최대 약 2000만원을 지원하는 전기차 보조금을 후불 마일리지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처음 나왔다. 웃돈을 받고 중고차로 거래되거나 렌터카 등 사업 자격을 획득하기 위해 타지도 않는 전기차를 구매하면서까지 보조금을 악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한정된 예산 탓에 정작 전기차를 구매하려는 선의의 피해자가 매년 늘고 있어 정부의 보조금 정책 개선이 시급하다. 또한 충전기 보급 정책은 충전기 수를 무작정 늘리기 보다는 기존 시설 보수나 실제 충전 수요가 많은 지역을 고려한 설치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6일 폐막한 제주국제전기차엑스포 기간 중에 한국전기차사용자협회(KEVUA) 주최로 '환경부 전기차 보조금 정책 개선 방향'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는 전기차 보조금 악용한 사례를 막기 위한 방법으로 전기차 주행에 따른 후불 마일리지제 도입과 전국 충전인프라 효율적인 확대 방안 등이 실제 전기차 사용자들 아이디어로 도출돼 주목을 받았다.

◇주행거리 기준 후불 마일리제 도입해야
국가 전기차 보조금을 차량을 구매할 때 단번에 지급하지 않고, 실제 운행한 주행 거리를 따져 나중에 보조금을 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기차 구입만으로 당장 교통환경 대기질이 개선되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실제 전기차를 운행할 목적이 아니라 웃돈을 받고 차를 팔거나, 렌터카 등 사업자격을 획득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한정된 정부·지자체 예산이 정작 필요한 일부 수요층에 쓰이지 않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전기차 이용자 신지훈(쏘울EV·Volt)씨는 “지자체별로 추가 보조금 액수가 다른점을 이용해, 보조금이 낮은 지역에 웃돈을 얹어 파는 사례가 늘고 있다”면서 “정부가 보조금을 주는 목적이 차량수를 채우는 게 아니라 대기질 개선인 만큼 지자체 보조금을 마일리지 방식의 후불 보조금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조금을 많이 주는 지자체의 전기차를 구입해 해당 지자체 명의를 유지하면서 전기차 선호도가 좋은 지역으로 판매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차량 구매 이후 일정 주행 거리 기준을 정해 보조금을 후불제 형식으로 차등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공현택(SM3 Z.E.)씨는 “전기차 보조금이 점차 줄어드는 데엔 공감하지만, 불과 3000~5000㎞도 주행하지 않은 전기차가 웃돈을 얹어 중고차사이트에 쏟아지기 시작했다”면서 “특히 일반 전기차보다 저렴하게 구입한 전기택시는 시급하게 손봐야할 대상”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보조금 악용 사례를 막기 위해 지자체별로 관리 감독 체계를 강화해야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원재(아이오닉EV)씨는 “지자체별로 지금의 전기차 양도 제한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강화하는 등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면서 “완성차 업체가 차량 출시 전부터 사전 예약을 실시한 탓에 일부 예약자는 자신의 빠른 (차량 인도)순번 자격을 이익을 보고 팔거나, 중복 예약하는 일도 많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날 제주지역 렌터카 업체들이 정부 보조금으로 전기차를 저가로 대량 구매해 놓고도 활용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왔다.
렌터카 업체 한 관계자는 “도내 업체 중 렌터카 사업자 자격을 획득할 목적으로 차를 대량 구매해 방치 중인 업체도 있다”면서 “마일리지제도를 도입한다면 이 같은 보조금 남용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환경부는 보조금 후불 방식 도입 등을 관련 정책을 개선하겠다는 입장이다.
박선하 환경부 보급담당 사무관은 “지난해부터 전기차 수요가 크게 늘면서 보조금이 충분한 마중물 역할을 했다”면서 “보조금 차등제로 개선했지만 아직도 개선할 부분이 있는 만큼, 차량 운행 단계에서 혜택을 누리도록 정책 개선을 검토하고, 방치 중인 렌트카 전기차도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충전인프라 보급정책 다양성 갖춰야
이날 전기차 사용자 대부분은 정부의 충전인프라 보급정책이 전기차 보급 확대로 물리적인 확장보다는 차량 유형·충전 수요에 맞는 다양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원재(아이오닉EV)씨는 “공용충전기 설치 기준에 주차 100면과 4대보험을 갖춘 시설이어야만 가능한 구조”라면서 “정작 필요한 충전 접근성이 필요한 곳보다는 대기업이나 가능한 기준이다”고 말했다. 공용시설 충전기 보급 기준을 상시 개방과 접근성을 고려해 완화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최영석(i3·Bolt)씨는 “전국에 사용하지 않는 공용 충전기가 여전히 많다”면서 “충전기를 늘리기 보다는 충전 활용도를 높이도록 인센티브를 주거나, 시설 품질을 높이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초급속 충전을 받아들일 전기차가 거의 없는데 400㎾급 초고속 충전기를 보급하는 건 보다 신중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충전기를 주거 환경에 따라 다양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박용희(쏘울EV)씨는 “완속충전기 기준을 7㎾로 규정할 게 아니라 주거 환경을 고려해 그 이하로 낮춰 보다 많은 사람이 안전하게 쓸 수 있도록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공동주택의 수전설비나, 차량 수요를 고려해 정책이 개선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환경부 박선하 사무관은 “공용충전시설 보조금 지원 설치 요건을 완화하도록 검토하겠다”면서 “필요한 장소에 충전기가 들어서도록 필요한 의견을 최대한 수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하는 전기차 충전구역 내 일반 내연기관차량의 불법주차 근절과 충전 방해 행위를 막기위한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을 앞두고 산업부와 이용자 간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김기열 사무관은 “충전구역 불법 주차 벌금은 20만원으로 예정돼 있지만, 이는 (전기차) 보급을 늘리기 위한 것이지, 벌급 부과가 목적이 아니다”면서 “아파트 등 공동주택 충전구역 불법 주차 기준은 해당 사항이 없고, 충전 이후에도 장시간 충전소를 점유하는 것도 제재하도록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태준 자동차 전문기자 gaius@etnews.com
 KEVUA > 협회 소개 > 협회 활동
KEVUA > 협회 소개 > 협회 활동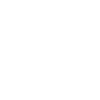



Comments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