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 책정도 서비스도 허술"…어설픈 충전 인프라에 운전자 불편 가중
[앵커멘트]
우리나라의 전기차 충전기 보급률은 세계 1위지만, 운전자들은 이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잦은 고장이나 관리 소홀에 회사마다 다른 결제 방식, 기준이 없는 요금까지 불만을 토로하는 운전자들이 많은데요. 머니투데이방송은 두 차례에 걸쳐 충전 인프라의 현 주소와 선진화 방안을 짚어봅니다. 최유빈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두 달 전 전기차를 구매한 박 씨는 장거리 운전 중 충전기를 찾느라 한참을 헤맸습니다.
휴게소 충전기를 찾아갔지만 막상 모두 고장이 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전기차주 : 6~7대의 충전기가 있었는데 그 중 두 대만 전원이 들어와 있는 상태였고요. 충전을 하기 위해 차량과 연결을 했는데 충전이 되지 않는다고 메시지가 왔습니다. 그 다음 휴게소 또한 충전기 한 대가 고장이 나있어 충전을 하지 못하고... 총 네 번을 시도했을 때 충전을 해서 올라올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처럼 충전기 관리가 미흡한 건 '질보다 양'에 초점을 맞춘 정책 때문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현재 수십 개의 중소사업자들은 정부 보조금을 받아 충전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업체는 보조금만 받은 채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에 충전기를 설치하거나 고장을 방치하고 있다는 겁니다.
[김성태 / 한국전기차사용자협회장 : 충전 인프라 사업자나 충전 제조사 입장에서는 정부 보조금을 타서 설치를 하는 게 가장 우선이거든요. 설치만 하고 한번 고장 나면 안 고쳐지는 경우도 많고, 콜센터도 제대로 운영 안 되는 곳이 많고.]
충전기 사업자별로 각기 다른 어플을 다운받거나 카드를 소지해야하는 것도 번거로움을 더합니다.
[전기차주 : 회원가 비용으로 하려면 앱을 다운받거나 카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저 또한 여덟개 이상의 앱이 깔려 있거든요.]
이와 함께 요금 측면에서도 운전자들의 불만이 나옵니다.
충전요금 책정에 대한 기준이 없어, 사업자가 가격을 급격히 올리면 그 부담이 모두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민간 완속충전기 점유율 1위 기업은 지난달 충전요금을 한번에 41%나 올렸습니다.
게다가 정부가 다음 달부터 공공급속충전기 가격을 올리면서 충전요금 시장 가격이 연쇄적으로 오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전기차 전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허술한 인프라에 충전 시장 선진화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유빈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KEVUA > 협회 소개 > 언론 보도
KEVUA > 협회 소개 > 언론 보도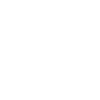




Comments 0건